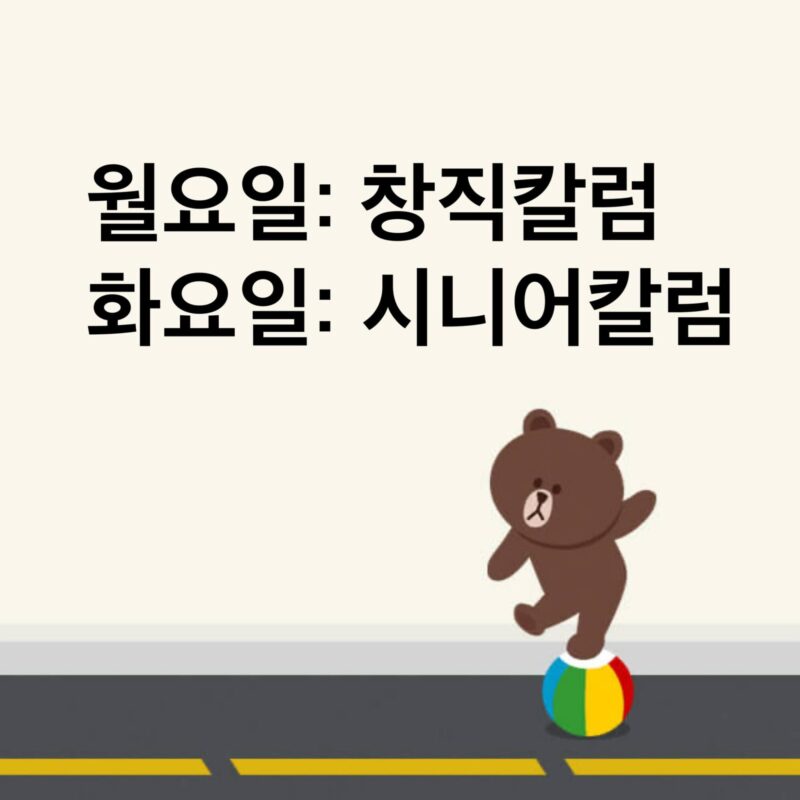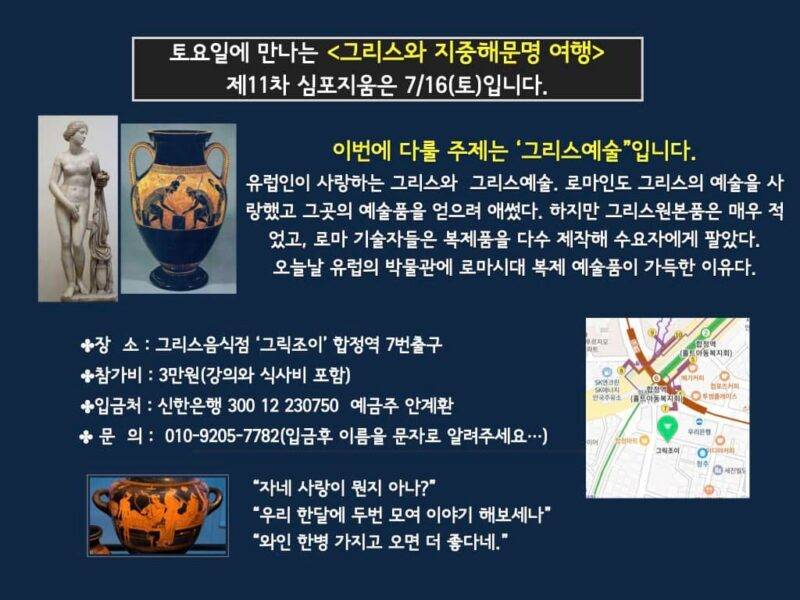속속들이 봄의 한복판이다. 봄꽃들의 이어달리기에 ‘꽃멀미’가 날 정도다. 동백이 매화에 바통을 넘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100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한 벚꽃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이에 질세라, 남녘에서부터 올라온 진달래가 산야를 붉게 물들인다. 하나같이 철겨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철다툼’을 벌인다. 철겨움은 제철에 뒤져 맞지 않은 걸 말한다.
몇 년 전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꽃도 이런 인간사를 닮아가는 듯싶다. 간발의 차로 흐드러지게 피어 봤자 들러리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허름한 담벼락이라도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려 안간힘을 다하는 것 아닐까. 마치 저절로 삶이 열리는 게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나저나 봄바람이 살랑 불기만 해도 맥없이 꽃잎을 떨구는 게,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는 듯 영 안쓰럽다.
‘꽃을 단’ 예쁜 우리말이 많다. ‘꽃눈’, ‘꽃보라’, ‘꽃멀미’, ‘꽃잠’ 등이 그렇다. 잠깐 동안 눈이나 비가 꽃잎처럼 가볍게 흩뿌리듯이 내리면 꽃눈, 꽃비다. 꽃보라는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많은 꽃잎을 말한다. 꽃보라가 날리는 들판을 걷다 보면 꽃향기에 취해 어찔어찔해진다. 이게 꽃멀미이다.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웹사전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꽃대궐’은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핀 모양이 마치 대궐과 같음을 이르는 말이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487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