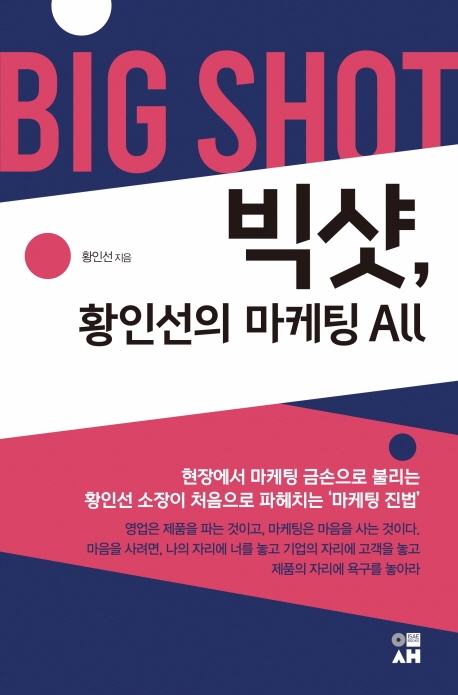김선달은 서울 장안을 자주 드나들었다. 어느 날에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로 구경을 나섰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 닭장(鷄市場)이 서 온갖 닭들이 우글댔다. 김선달이 닭장 속을 이리저리 보니까 유난히 살이 포동포동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닭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김 선달은 시치미를 떼고 닭 장수에게 물었다. “주인장, 이게 무슨 날짐승이오? 거참 통통한 게 보기 좋구먼.”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세상에 얼치기가 많다고 하더니만 이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구나. 닭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니 꽤나 어리석은 놈인가 보다.’ 주인은 김선달이 얼치기인 줄 알고 골려 먹을 셈으로 말하였다. “이것은 봉(鳳)이오.” 난데없이 닭을 봉황새라고 속이는 말을 듣고 김선달이 말하였다. “뭐, 봉이라고? 오호, 말로만 듣던 봉황새를 여기서 제대로 보게 되었구나. 그래, 그 새도 파는 것이오?” “물론이오. 팔지 않을 거면 뭐하러 장터까지 가지고 나왔겠소?” 주인은 제대로 걸려 들었구나 생각하였다. “값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오?” “열 냥만 내시오.” 닭은 한 냥씩 받고 팔고 있지만 봉은 닭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열 곱은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주인의 주장이었다. 김 선달은 값을 깎을 생각도 하지않고 주인이 달라는 대로 열 냥을 고스란히 건네주고 닭을 샀다. 그리고는 곧바로 관가로 달려갔다. 김선달은 관가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품에 안고 온 닭을 보여 주며 말하였다. “내가 방금 귀한 봉황을 구해 왔는데, 이것을 사또에게 바치려고 하오. 사또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김선달은 닭을 가지고 사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천지개벽을 한들 닭이 봉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김선달은 사또를 희롱한 죄로 곤장 열 대를 맞았다. 꼼짝없이 곤장 열 대를 맞은 김선달이 눈물을 찔금거리며 사또를 향해 하소연을 하였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닭을 봉이라고 속인 죄가 없다는 것이냐?” “저는 그저 닭장수가 봉이라고 하기에 닭값의 열 배를 치르고 샀을 뿐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분명히 닭장수가 봉이라고 했단 말이냐?” “예,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왜 닭값의 열 배나 치렀겠습니까?” 사또는 제법 영민한 사람이어서 상황을 금방 눈치채고 닭장수를 불러들이게 하여, 물었다. “네가 닭을 봉이라고 속여 열 냥을 받고 판 게 사실이냐?” 볼기를 맞아 얼굴에 잔뜩 독이 오른 김선달이 노려보고 있는지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닭장수는 사실대로 고하였다. 사또가 김선달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김선달이 대답하였다. “저 자가 저를 속여 공매를 열 대 맞았으니까 저도 그 대가는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닭값의 열 배를 주고 가짜 봉을 샀듯이 저자에게 제가 맞은 곤장의 열 배인 백 대를 쳐주시던지 제가 저 자에게 준 열 냥의 열 배인 백 냥을 저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공정할 듯 싶습니다.” 사또가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결국 닭장수는 거의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여 곤장 백 대를 대신하여, 김선달에게 백 냥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각지에 퍼져 사람들은 김선달의 이름 앞에 ‘봉이’라는 별칭을 붙여 ‘봉이 김선달’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리숙하여 무엇이나 빼앗아 먹기 좋은 사람을 농으로 말할 때 ‘봉 잡았다.’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