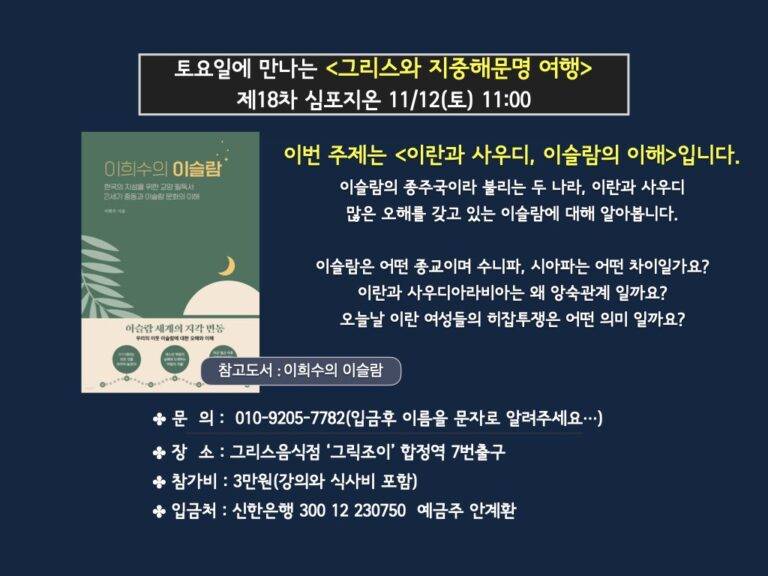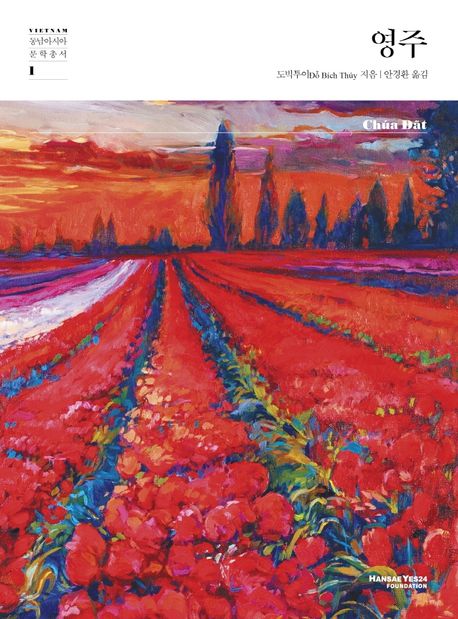자료를 찾다가 『장미의 이름』에 손이 닿았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세계적인 언어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베스트셀러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이 책에 별다른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화자인 아드소 수사가 스승 윌리엄 신부와 뮌헨에서 작별하는 장면에 눈길이 꽂히면서 한숨에 다 읽어 버렸다.
“우리가 사는 14세기 중엽 유럽을 휩쓴 대역병(흑사병) 시기에 윌리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주 오래 뒤에 들었다.”
팬데믹이라는 코드를 통해 700년의 긴 시간을 건너뛰어 이 소설과 다시 연결된 것이다. 『장미의 이름』은 흑사병이 아직 유행하기 이전인 1327년 11월 말에 수도원에서 평생 양피지에 필사하면서 살아온 수도사들을 배경으로 7일 동안 벌어지는 추리소설이다. 중세의 역사, 언어, 부호에 해박한 사람답게 수도원과 도서관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책의 머리말에는 중세시대 지식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고백을 흥미롭게 인용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에서 평안을 찾아보았으나 그 평안은 구석에서 책과 안에 있을 때가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다.”
칼럼 전문보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564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