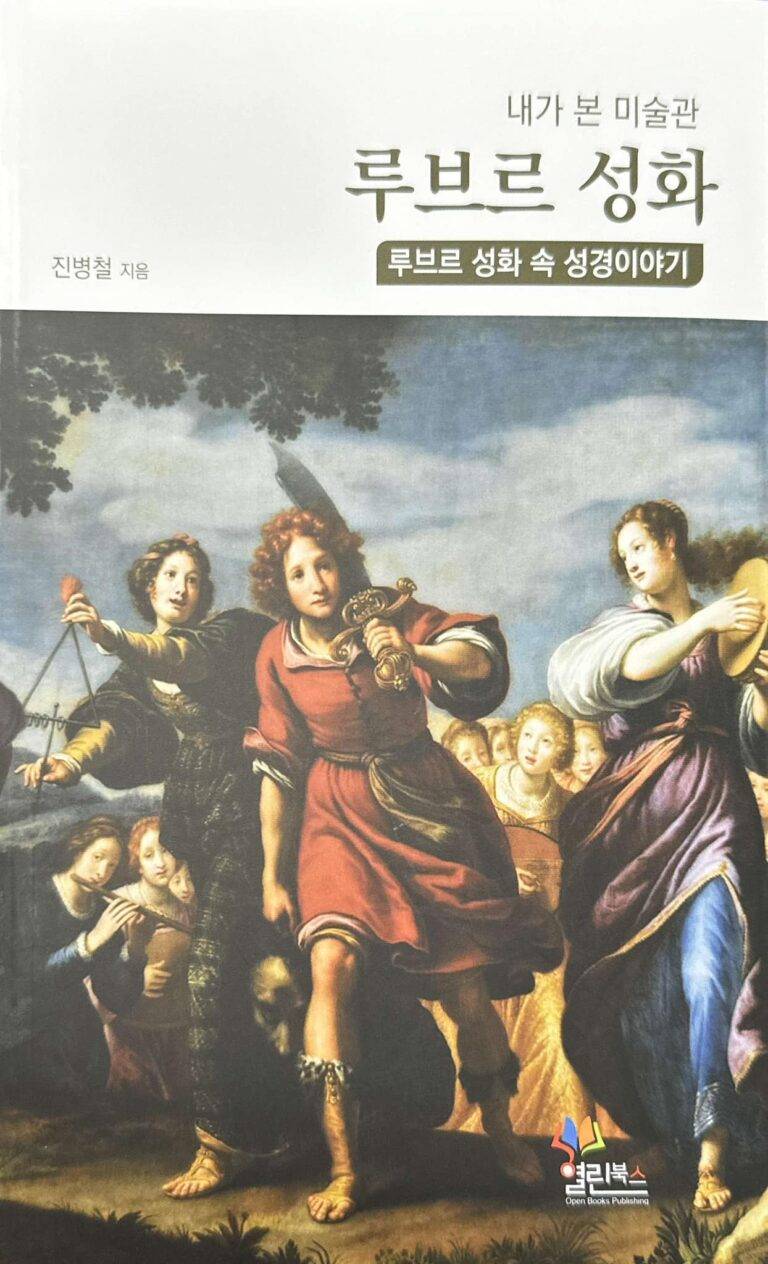아삭아삭한 콩나물에 향긋한 미나리가 섞인 ‘아구찜’(표준어는 아귀찜이다)을 먹을 때면 이상하리만치 ‘멍게’를 떠올린다. 오래전 한 선배가 들려준 ‘멍게와 우렁쉥이’ 얘기 때문에 생긴 고약한 버릇이다.
멍게가 우렁쉥이의 사투리이던 시절. 어느 음식점 차림표에 멍게와 우렁쉥이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닌가. 호기심이 동한 선배가 까닭을 묻자 주인은 “멍게를 찾는 손님도 있고 우렁쉥이를 찾는 손님도 있어 우리 가게엔 둘 다 있다는 뜻으로 써놓았다”라고 하더란다. 말의 뜻을 더하고 변화시키는 건 언중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 절묘한 선택에 선배는 무릎을 쳤다고 한다.
멍게는 1988년 복수표준어가 됐다. 잘 알다시피 지금은 우렁쉥이보다 훨씬 더 자주 입말로 오르내린다.
‘아구찜’도 내겐 그런 멍게 같은 음식이다. 아무리 마음먹고 ‘아귀찜’이라고 해도 ‘아구찜’이랄 때의 그 음식의 맛이 당겨오지 않는다. 아귀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굶주린 귀신이 떠오른다.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는 귀신 말이다. 또 있다.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아귀다툼’도 그렇다.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44280?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