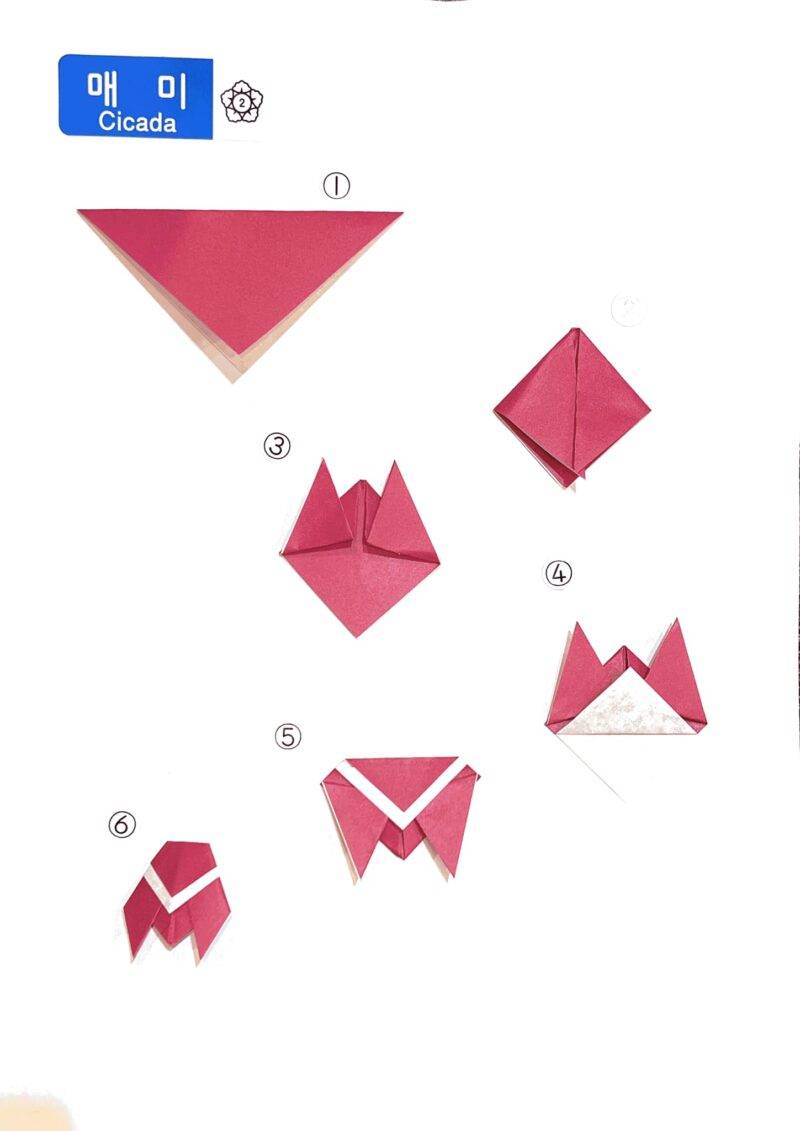출판사 서평
시를 통해 작품을 천천히 사유하는 즐거움
시인의 예술 읽기는 문학의 자리로 돌아온다
『예술의 주름들』의 바탕에 흐르는 일관된 시선은 ‘시를 통한 예술 읽기’다. 시인은 시적 서정이나 태도가 담긴 예술에 눈 돌리고, 언뜻 시와 무관해 보이는 작품 앞에서도 시를 떠올려, 이를 돋보기 삼아 작품과 만나는 것이다.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수영장〉 시리즈로 유명하지만, 나희덕이 주목한 것은 그의 판화 연작에 드러난 문학적 요소, 즉 그림과 시 텍스트가 결합된 방식이었다. 호크니는 월트 휘트먼, 에즈라 파운드 등을 비롯한 몇몇 시인들의 시를 그림 속에 문자 이미지로 자주 인용하곤 했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그의 성정체성 등 정체성 위기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영화 〈타인의 삶〉을 보면서는 한 극작가의 삶을 감시하는 동독 비밀경찰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질문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인이 짝지은 아담 자가예프스키 시는 영화 읽기의 열쇠가 된다. 폴란드의 시인 자가예프스키의 시「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에서처럼 주인공이 마주한 타인의 시선은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교감을 열어주는 통로”로 기능한다.
자가예프스키는 말한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고. (…) 시적 화자가 앉아 있는 곳은 닫힌 방이 아니라 저녁 무렵의 광장이다. 그 열린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며 화자는 “저마다 다른, 각자 뭔가를 말하고, 설득하고, 웃고, 아파하는 얼굴들”을 읽어내려고 애쓴다. 레비나스가 말했듯이,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불현듯 들이 닥치는 존재들이다. 그 순간 타인의 얼굴은 “등불처럼” “용접공의 점화기처럼” 빛난다. 이렇게 아름다움이란 늘 바깥에 있는 어떤 것,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것이다. 〈타인의 삶〉에서 비즐러가 마침내 도달한 얼굴처럼.
_246~248쪽
문학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예술 읽기는 때로 시인 자신의 시를 호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인은 롤랑 바르트의 어머니와 사진작가 한설희의 사진 속 푼크툼의 순간을 다룬 장에서 자신의 시「주름들」을 인용한다. 시 속에서 화자는 엄마의 주름이 “골짜기처럼 깊어 / 펼쳐들면 한 생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며 주름을 통해 당신의 전체를 마주했다고 고백한다. 또한 저자의 몸을 통과한 작품은 그대로 시가 되기도 하여, 크고 작은 집들로 채워진 장민숙의 반구상 회화 〈산책〉은 「창문성」이라는 시를 낳았다. 회화 〈산책〉이 창문의 색채와 형태를 통해 집의 표정을 전한다면, 「창문성」은 “눈빛” “입술” “항문”으로, 창문을 몸의 일부에 빗대어 독자로 하여금 집과 좀 더 내밀한 관계를 맺도록 이끌며 그림의 의미를 확장한다. 이처럼 시적 상상력으로 예술을 쓰다듬은 『예술의 주름들』에서는 “시와 예술 사이에” 난 여러 갈래의 “작은 길”들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