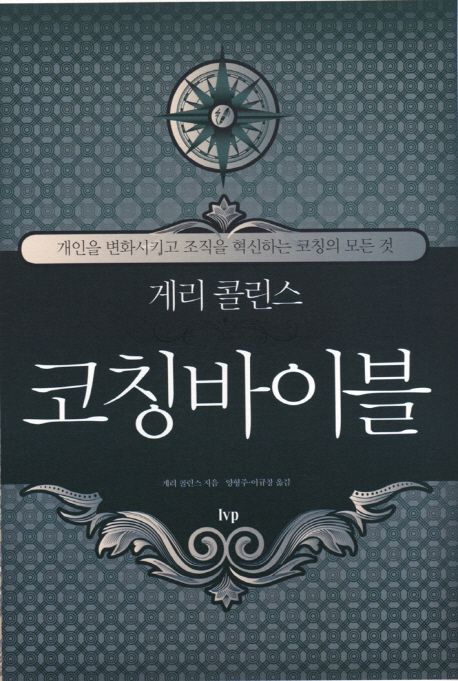“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라.” 씨도 먹히지 않을 소리임을 알면서도 아뿔싸, 밥상머리에서 불쑥 내뱉고 만다. 밥알을 ‘세고 있던’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바쁘다며 벌떡 일어선다. 조금이라도 더 먹일 요량으로 고봉밥, 감투밥 비스름하게 담아낸 아내의 얼굴은 얼추 울상이 됐다. 그날 눈칫밥보다 못한 집밥을 끼적끼적 먹었다.
집밥은 ‘집에서 만들어’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이다.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가족 간 소통과 관계를 확인하는 매개체이다. 요즘 대세가 된 먹방에서도 집밥은 단연 선두주자이다. 이는 거꾸로 집밥의 의미와 부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그중 ‘혼족’은 밥집에서 때우듯 먹고 말 때가 많다. 그러니 집밥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간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아 간다지만 해 먹자니 힘들고, 상을 차려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다.
말의 세계에서도 집밥과 식당밥의 처지는 다르다. 집밥은 2016년 표제어에 올랐지만 한 끼 적당히 때우는 성격의 식당밥과 즉석밥은 여태 웹사전에 머물러 있다.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23163?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