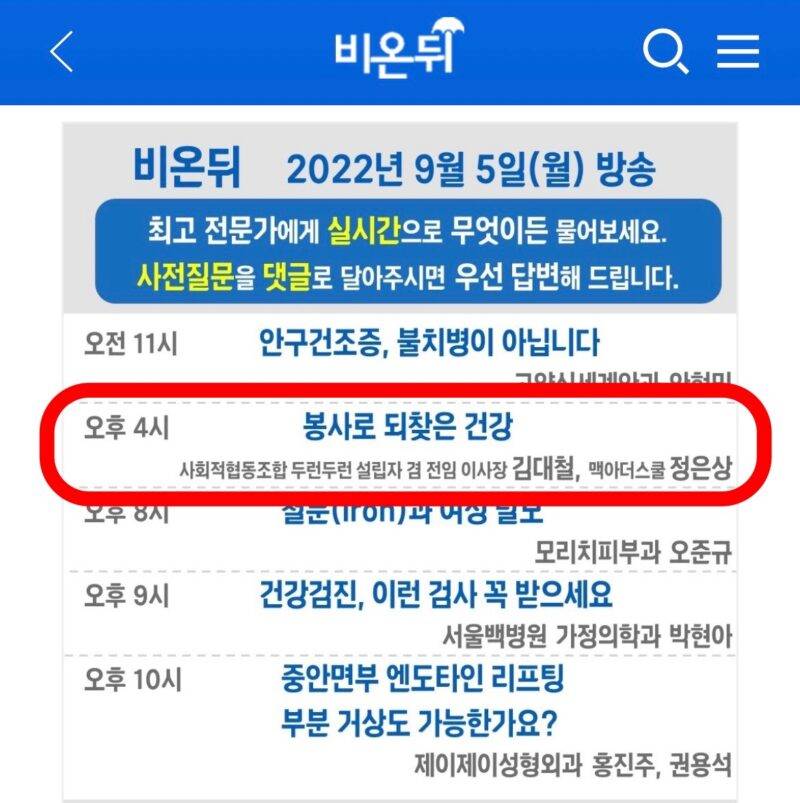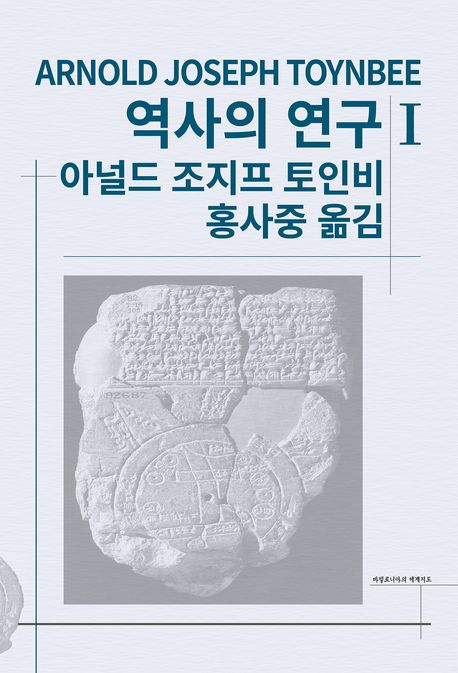늦가을 정취를 즐기려 산을 찾았다. 꽃비처럼 흩뿌려진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댄다. 지는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지만 왠지 짠하다.
산 정상과 쉼터 등에서 많은 등산객들을 만났다. 숨이 차 그랬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벗은 채 ‘맨얼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맨얼굴은 ‘화장 분장 따위로 꾸미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얼굴’이다. 한데 우리 사전엔 올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민낯’으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도 있다. ‘민낯 대화’를 나눈다고?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민’은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는’,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민소매, 민가락지에서 보듯 ‘민’은 무언가가 결여된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맨눈, 맨땅의 ‘맨’은 ‘무엇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라는 말맛을 풍긴다. 한때 신세대들이 즐겨 썼던 ‘생얼’ ‘쌩얼’은 세력을 잃어가지만 맨얼굴은 ‘화장기 없는 맨얼굴’ 등으로 자주 오르내린다. 그러니까 맨얼굴은 표준어로 자리매김하려 민낯, 민얼굴과 경쟁 중이다.
민낯 역시 언어 세계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중이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라는 뜻을 넘어,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인다. ‘정치(인)의 민낯’, ‘주택시장의 민낯’ 등.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21834?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