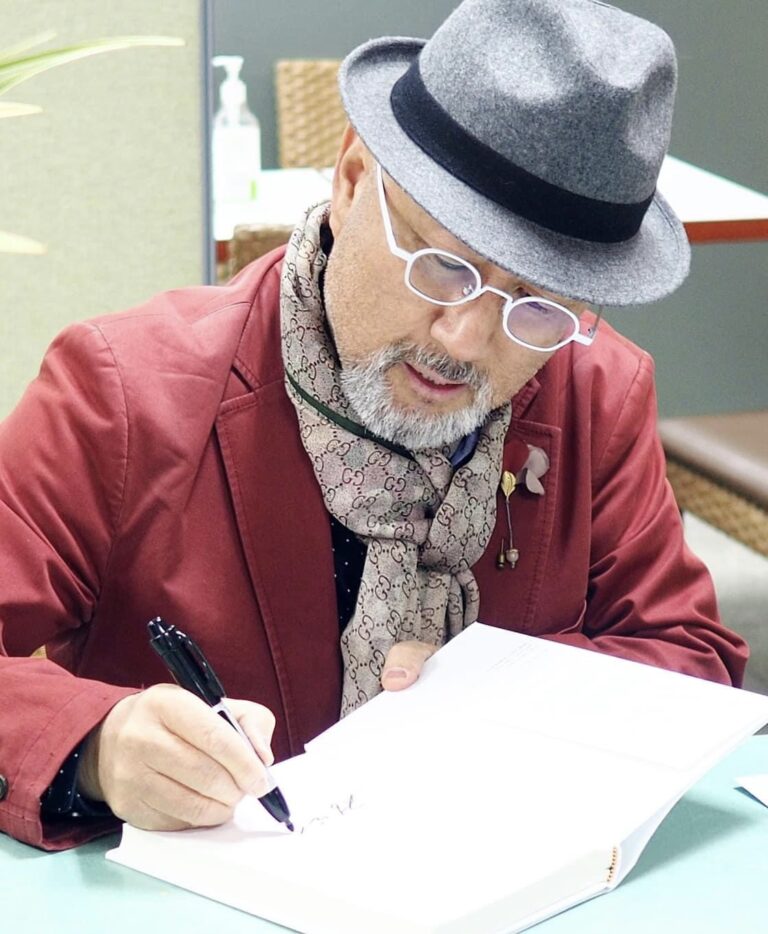1980년 초 필자는 첫 직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했다. 사용하던 컴퓨터는 일본 후지쯔였고 랭귀지는 COBOL이었다. 맨 먼저 시작한 일은 철강 회사 생산관리를 위한 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일이었다. 보고서는 아웃풋(output)이다. 회사의 최고 매니지먼트가 보고 싶은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해 레이아웃(layout)을 작성해야 한다. 인풋(input)은 아웃풋이 결정되고 나서야 무엇을 집어 넣을지 확정된다. 가끔 아웃풋을 확정하지 않고 인풋을 결정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시행착오도 생겼다. 그리고 종종 아웃풋이 확정되고 나서 인풋을 결정하고 프로그래밍까지 마쳤는데 최고 결정자가 아웃풋을 변경하는 바람에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열심히 독서를 하지만 글쓰기라는 아웃풋이 없다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독서라는 좋은 인풋이 아깝다. 필자의 주변에도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글쓰기를 권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저수지의 물이 흘러내려가야 썩지 않고 유지되듯이 아웃풋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면 인풋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부지런히 독서로 집어 넣기만 하고 끄집어 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된다. 물은 흘러야 모두에게 유익하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지만 나갈데가 없으니 소금으로 바뀐다. 우리의 내면은 부지런히 퍼내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시 끊임없이 인풋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이런 미래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퍼내고 채우는 지난한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끄집어 낼 게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머릿속에 뭔가 들어 있어야 끄집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꺼내면 계속 나온다. 끄집어 내기를 계속하면 허기가 느껴지고 뭔가를 다시 채워야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래서 최고의 아웃풋은 글쓰기이며 최적의 인풋은 독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거친 음식이 내장을 튼튼하게 하듯이 거친 독서는 영혼을 다듬어 정신을 맑게 한다. 부드러운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 꼭꼭 씹어서 목구멍에 넘겨주는 유튜브 독서나 오디오북은 종이책을 눈과 엉덩이로 하는 독서보다 결코 좋지 않다. 물론 그런 부드러운 독서를 제공하는 자가 돈은 벌겠지만 독서 소비자에게는 독이 된다는 말이다.
인풋없는 아웃풋은 기대할 수 없지만 아웃풋을 먼저 결정하지 않는 인풋은 허공에 대고 쏘아대는 공포탄과 같다. 열심히 글을 쓰면 독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꾸준히 독서해도 글을 쓰지 않으면 나만의 지식 잔치에 그치고 만다. 머리에 든 게 많고 몸이 부실하면 가분수가 되어 균형감각을 상실한다. 독서와 글쓰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삶의 밸런스도 자연스럽게 맞추어진다. 결국 밸런싱의 문제로 귀착된다. 아웃풋을 멋지게 디자인하면서 인풋을 예상하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나중에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기쁨이 실로 크다. 반대로 아웃풋을 예상하지 못하고 인풋 데이터를 무심코 집어 넣었을 때 결과는 불을 보듯 엉망이 되고야 만다. 좋은 인풋은 아웃풋이 뿌린 씨앗이다. 독서가 그렇다.